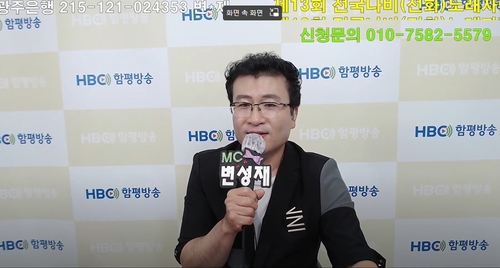꽃단지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
"꽃단지라고 아요?"
"꽃단지?"
"꽃 파는 데 아니여?"
"아따 그런디 아니고 꿀단지 하듯이 단지 항아리 말이어라우."
평소 함평 고향 얘기라면 좋아하는 나에게 꽃단지 얘기를 꺼낸 날, 유진이는 "너 그럴 줄 알았다." 직접 대고 말하지 않았다.
함평에 새 소식이나 큰 일을 전하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는 이미 계산하고 말할뿐이었다.
"덥썩 물었구만. 흐흐흐흐흐"
전화 마지막에 그는 자기가 의도한대로 내가 관심이 동하였음을 맞췄다는 듯이 즐거워했다.
꽃 단지? 그러고 보니 어릴 적 우리 집에도 오가리, 단지, 독이라고 부르는 여러 질그릇이 장독대에 줄 서 있던 게 생각났다.
"함평서 생산된 단지 항아리가라우 민속품 시장에서 '함평 꽃단지'라고 고유명사같이 불려지며 팔린다안허요."
유진이 목소리는 약간 흥분되어 있었다. 사실 나도 뜻밖이였다.
유진이의 말중 '함평이 고유명사 같이' 이 대목에서는 말은 안 했어도 내심 놀랬다. 확 끌렸다. 자석에 쇠붙이가 당겨 가는 듯이 나는 빠져 들고 있었다.
함평이 고유명사 같이 불려진다. 그렇다면 함평 것이 최고라는 의미일 수 있을 거다. 나는 신이 났다.
'함평 꽃단지!' 이 단어를 나는 바로 검색해 봤다.
그랬다. 정말 꽃단지 앞에 '함평' 두 글자가 딱 허니 씌여 있었다. '꽃단지, 함평 꽃단지!'
그 날 부터 내 머릿속에는 이 단어가 요동을 쳤다. 그러면서 함평 꽃단지가 왜 유명해졌을까? 이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문득 손불 살았다는 하순이가 생각났다. 언젠가 아버지가 옹기 그릇을 만드셨다고 말 했기 때문이다.
'작은 단서라도 잡을 수 있겠다.'
하순이에게 바로 전화를 했다.
"아버지께서 남긴 유물 같은 거슨 없어라우.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싹 없어져부럿재라우. 동네 사람들이 거의 옹기그릇을 만들었는디 동네에 백토라고 흰 흙이 나는 디가 있었어요. 굴 파댓기 군데군데 파서 썼어라우."
하순이의 얘기를 듣고 유진이가 잠깐 비춘 백토 산지가 손불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이 '백토'라는 흙이 함평 도공들의 손재주에 의해 지금의 명품 꽃단지가 만들어졌으리라는 짐작이 갔다.
그렇다면 백토로 그릇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흰 흙으로 모양만 냈는지? 왜 단지를 꽃단지라 부르는지? 거미 똥구멍에 실 나오듯이 의문이 줄을 섰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하게 나는 상수가 집 짓는다고 닦아 놓은 집터를 가게 됐다. 손불면 초입이었다.여기서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형님, 쩌기 보이는 디가 '행남자기'라고 있재라우? 거기 도자기 공장에다가 백토 흙을 파서 팔아 먹은 디어라우. 여기 흰 흙 보이지라우? 이거요. 희컨 흙, 백토가 이거요."
단박에 문제를 처리하듯 상수 말은 경쾌했다. 내가 궁금해 하던 몇가지도 더 얘기해줬다.
행남자기? 그때 나는 상수를 통해 이 단어도 참 오랫만에 들어보았다. 행남자기 그릇은 유명했다. 특히, 행남자기 찻잔에 커피를 마셔줘야 뭐라할까? 요즘으로 치면 잘 나가는 집이요, 회사였다. 폼이 난다고 할까?
아! 이런 고급진 행남자기 재료가 함평 백토였다니 상수 말에 나는 괜히 우쭐해졌다.
꽃단지로 이미 자석에 쇠붙이가 된 나는 함평 백토와 행남자기라는 자석에도 당겨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사람과 만나는 운이 좋다.
지난번 함평 호랑이 이야기를 쓸려고 할 때도 그랬다.
해보 회화정 마을에 들어서서 말씀을 여쭸는데 그 분이 최춘산씨였다.
차를 세워 단박에 찾아야 할 사람을 만나 뵌 것이다.
그 이후 나는 최춘산씨를 통해 함평 호랑이 이야기를 술술술 이어갈 수 있었다.
이번에 나는 함평 꽃단지와 백토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 손불 죽림 마을을 찾았다.
옹기를 제작했던 마을이라는 얘기만 듣고 나선 나는 농사 일로 바쁜 시기라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마을에 도착을 했다.
마침 마을 비석 앞을 지나가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다.
차를 세워 인사를 드렸다.
이 분은 함평 죽림 마을에 사시는 81세 정경심 여사님이시다.
"우리 신랑이 옹기 구웠어라우. 지금은 옹기 굽던 사람들은 다 돌아가시고 동네에 암도 안 계시재라우."
"우리 집 아저씨 성함은 최병렬씨여라우.
크나큰 항아리도 만들었재라우."
나는 그 날도 운 좋게 정경심 여사님 같은 분을 바로 만났다. 말씀을 참 잘 하셨다.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게 설명하셨다.
"옹기 만들 때 흙은 어떤 흙을 썼어요?"
나는 백토의 쓰임새가 궁금해 이 질문부터 먼저 드렸다.
"지리라고 해라우. 갈맹기서 파다 썼어라우."
지리? 갈맹기? 지리가 뭐고 갈맹기가 뭔지 같은 전라도 출신에, 같은 함평 사람이 하는 말을 나는 못 알아 듣고 있었다.
"지리가 뭐고 갈맹기가 어디예요?"
나는 정경심 여사님께 여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옹기 만드는 흙을 지리라고 여기서는 해라우. 쩌기 손불 산남 방앳간 위 거기가 갈맹기요."
나는 정경심 여사님께 찾아오게 된 연유를 말씀드렸다.
함평에서 만든 단지가 민속품을 파는 곳에서는 유명하다라고 알려드렸다.
이곳 죽림 마을에 도공들이 특별한 흙, 백토를 써서 그런가 싶다며 백토 쓰임을 여쭤 봤다.
"백토라우? 백토는 떡고물말로 물레 바닥에다 칠허재라우. 옹기 바닥이나 뚜껑을 보면 쪼까 희커게 보입디요안? 옹기 처음 만들 때 백토를 썼재. 나머지는 지리를 썼어라우. 옹기 뚜껑 만들고도 위에다 백토를 발랐어라우. 글고 옹기를 다 만들어 가마에 넣어 구울 때 는 백토로 버버리 뚜껑이라고 만들긴 했어라우.
가마에다 옹기를 층층이 올릴 때 쓸라고 백토로 동그랗게 만들어라우. 이것이 버버리뚜껑이요."
'버버리 뚜껑이라?'
나는 어릴 때 말 못하는 사람을 버버리라고 놀리던 일이 생각 났다.
"왜? 버버리 뚜껑이라고 했다요?"
"모르재. 왜 버버리 뚜껑이라 했는지."
버버리뚜껑? 별 의미 없는 말 같으면서도 의미 있는 명칭일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글믄 함평백토꽃단지라고 말허든디 백토로 꽃 모양을 그렸으깨라우?"
내 질문에 얼척 없다는 듯이 정경심 여사님은 말을 이어갔다.
"아니여라우. 쩌기 우리 동네 앞에 흙이 좋은 것이 있어라우. 그 흙에다 꽁깍지 태워서 잿물하고 섞으재 그걸 약토라고 하는디 그 약토물에다 다 만든 옹기를 넣고 돌려, 꺼내서 손꾸락으로 모양을 그리재. 아니믄 나무때기로 모양을 내기도 허고."
인자 알아들었냐라는 듯이 정경심 여사는 옹기에 무늬내는 흉내까지 내셨다.
나는 이에 답하듯이 정리하여 말씀드렸다.
"백토는 물레 바닥이나 옹기 뚜껑 위에 붙지 마라고 문지르고 가마에 옹기를 쌓아 올릴 때 잘 떼지고 쌓기 좋게 하는 버버리 뚜껑 용도로 썼구만요이?"
"음, 그러재라우. 근디 그 때 백토 그 흙을 누가 자주 파갑디다."
결국 함평 백토 꽃단지라는 명칭은 옹기 바닥이나 옹기 뚜껑에 묻은 백토가 하얗게 모양이 나는 것에서 민속품 수집가들에 의해 붙여진 상표같은 명칭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정경심 여사와 작별인사를 나눴다.
옹기 마을에 옛 명성을 정경심 여사 혼자 기억하고 계시는 현실이 짠했다.
'누구 없오? 옹기 구우면서 죽림 마을서 살 사람 어디 없오?'
나는 손불 백토 출토지로 향하면서 몇번이고 소리내어 말하고 싶었다.
우리는 백토를 캐냈다는 손불 산남리 야산을 향해 차를 몰았다.
“이 동네에서 우리 외할버지가 살으셨어라우”
길을 잘 아는 상수가 운전을 해준 덕분에 쉽게 동네 입구에 들어섰다.
서너 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곳을 지나 차는 약간 경사진 길로 접어들었다.
포장도 안 된 도깨비 방망이 같은 울퉁불퉁한 길이다.
똑바로 앉아 있기 힘들었다.
트럭이 “부웅부웅” 야무지게 소리를 냈다.
그러자 어느새 운동장 같은 곳에 턱허니 올라 섰다.
어림잡아 삼백여평은 넘어보였다.
산 꼭대기라 짐작되는 곳이 한쪽에 보였다.
그 꼭대기를 기준으로 지금 서있는 곳까지 ‘꽤 많은 백토를 캐 갔으리라. 그 이후 평평하게 만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 때 상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몇년전에 여기를 판판하게 합디다. 뭣 헐라고 하는지. 그전에는 그냥 여기저기 파헤쳐진 상태로 있었어라우”
나는 풀이 자라오른 곳을 벗어났다.
산 꼭대기 일부 경사진 곳으로 갔다.
백토가 제대로 드러나 있었다.
백토는 뭉쳐진 돌멩이 같았다.
백토를 손으로 집어 보았다. 쉽게 뭉게져 가루처럼 묻어났다.
죽림 마을에 정경심여사님 말씀이 생각났다.
“처음 옹기를 만들 때 물레 위에다 떡가루 같이 백토를 묻혀라우.”
나는 그 말씀이 이해가 갔다.
옹기를 만들 때 꼭 필요했던 함평 백토.
이 백토를 본 다음 날 나는 도자기 회사에서는 함평 백토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행남자기 전화번호를 찾아내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불통이었다. 신문기사를 살펴보니 이미 부도처리가 된 회사로 나왔다.
다행스럽게 행남자기 자회사로 보이는 행천자기는 바로 검색이 됐다.
회사 주소지도 학교면으로 나왔다.
함평 읍내에서 참 가까웠다.
도착해 보니 공장 규모가 생각보다 컸다.
마침 김규식 행천자기 사장님이 밖에서 일을 하고 계셨다.
처음 도자기 회사는 ‘백제요업’이였다고 입을 떼셨다.
“백제요업은 박종학씨가 설립한 공장이요. 행남자기에서 부도난 백제요업을 인수했지라우. 행천자기라 회사명을 걸고 주로 미주지역으로 수출용 도자기를 생산했어요.”
내 기억으로도 행남자기는 국내에 잘 알려진 브랜드였다.
하지만 행천자기를 몰랐던 까닭이 수출 브랜드라서 그렇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었다.
“도자기 만드실 때 백토를 사용하셨어요?”
“예 사용했지요.”
“그럼 손불 백토를 갖다 썼으께라우?”
“손불 백토는 안 썼어요.”
뜻밖의 대답이었다.
“함평 백토를 안 썼으면 어디꺼 썼으께라우?
손불꺼 백토를 행남자기서 갖다 썼다는디라우”
“그럼디요. 제가 입사하기 전에는 행남자기서 아마 갖다 썼을 것이요. 우리 때는 단가가 안 맞았을 것이요. 가공 되어서 들어오는 동남아 지역 백토가 좋기도 했구요. 그놈 썼어요.”
“그러면 함평 흙은 안 썼네요이?”
함평 백토를 안 썼다는 얘기에 웬지 나는 서운했다.
“예, 함평 백토는 안 썼어요. 근디 점토는 함평거 썼어요.”
“왜? 점토를 써요? 점토가 어디서 났다요?”
“저기 엄다 가기전 해정 부락 앞에 광목간 도로 근방 논 있잖아요.거기 논에서 한 2미터 파믄 좋은 흙이 나와요. 그놈 캐다 썼어요.”
“아니, 흰 도자기를 점토로 만듭니까?”
나는 도자기에 대해 무지하기에 또 여쭈었다.
“백토로만 자기를 안 만들어라우. 여러 가지를 섞으재라우. 섞어진 점토가 시컴해도 구우면 하얗게 되라우.”
꺼먼 점토가 하얀 도자기가 된다는 게 나는 신기했다.
“사장님, 지금 행천자기는 생산 됩니까?”
“여기서는 인자 생산이 안 됩니다. 인건비가 올라서 힘들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생산시설을 다 정리했째라우. 예전에 함평사람들 300여명이 우리 회사에 다닐 때가 절정이었요. 지금은 무안 청계농공단지에서 도자기를 우리한테 납품하면 우리가 기존 영업망은 있은 게 전국으로 판매는 하지요.”
김규식 사장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나는 물러났다.
미주 지역으로 수출된 함평 행천자기!
지금은 여러 사정으로 중단되었지만 내 고향 함평에 흙, 점토로 구운 도자기가 수출되었다는 게 자랑스러웠다.
|
▲ 멀리 보이는 곳은 지리라는 흙을 파왔던 손불 산남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