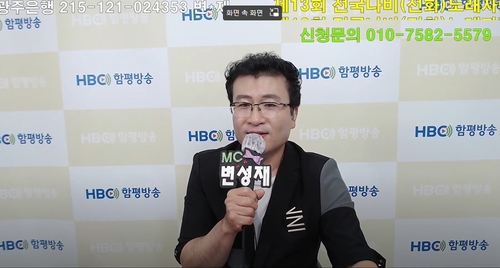|
함평에는 선박마을이 있다. 선박? 얼른 배를 생각한다. 하지만 이 선박마을은 ‘‘배를 묶는다’’라는 의미다. 배선(船)자에 머문다는 뜻의 머무를 박(泊)이다. 순우리말로는 ‘‘배문이’’라고 한다.
마을은 석화산을 옆에 끼고 대봉산을 품에 안고 있는 형국이다. 배를 묶은 지세다. 선박이라고 지칭하는 이유를 풍수지리에서 비롯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실제로 옛날에는 고막천에서 이곳 선박마을까지 배가 들어왔다 나갔다 했다. 지금은 나산면에 속하는 이 곳 선박마을은 예전에는 식지면에 속했다. 식지천 물길을 따라 나산강을 거쳐 고막까지 물길이 닿았고 멀리 목포 앞바다로 연결되었다. 비교적 내륙 깊숙히 들어 온 이 선박마을은 뱃길 종착지이자 출발지이다.
이 마을은 주로 선산 김씨가 살고 있다. 지금은 김해 김씨도 꽤 많이 살고 계신다. 선산 김씨의 사당인 ‘선호서원’이 마을 정상부위에 자리하고 있다. 이 서원은 1982년도에 새로 지어졌다. 옛 서원도 마을 고개를 넘어서려는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함평 군사에 의하면 “선산김씨는 영남에서 난을 피해 이곳으로 와서 정착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1498년 무오사화 때 김종직이 부관 참시를 당하는 화를 입자 그를 따르던 선산 김씨 석규가 영남에서 난을 피해 이곳에 와 정착하였다. 이 선박마을에는 이보다 먼저 강산 이씨가 살았다고 한다. 마을 형성은 500년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5월 30일 선박 마을에 들렀을 때다. 전날 오랜만에 비가 내려서인지 분주히 일하시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모종한 고구마 순에 물을 주고 계시는 김동남(60)씨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김동남씨는 이곳 선박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했다. 나산에서 나산중학교까지 마치고 광주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지금 까지 광주에서 생활한다고 했다. 광주 금호타이어에서 근무한다는 김동남씨는 어머니 농사 짓는 일을 도우러 오셨다고 하셨다. “여기 논이 우리 논이예요. 오늘 써레질 한다해서 내려왔습니다. 비가 더 왔어야 하는데 찔끔 내리고 말아서 어머니 드실 고구마가 땅 속으로 기어들어가게 생겼네요.”
어머니께서 텃밭처럼 가꾸는 곳에 연신 하천물을 뜨다가 멈추더니 김동남씨는 말을 이어갔다.
“옛날에 우리 마을이 100가구가 넘었다고 해요. 지금은 30가구나 될려나 싶어요. 한 집 걸러 두 세 집이 다 빈집이예요.”
김동남씨 어머니 정순임씨(88)는 집 앞 논에 모를 심기 위해 써레질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 예전같으면 사람이 들어가 소를 끌어 쟁기질을 하고 써레질을 했을 논에 지금은 트 럭터로 몇 시간만에 끝내는 시대가 되었다. 모 심는 일도 이앙기로 금방 끝내버린다.
“트랙터로 200평 쟁기질하고 써레질까지 하는데 삯이 8만원, 이앙기로 모 심는데는 5만원의 삯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논을 고르는 써레질 현장에는 언제 나타났는지 백로 한 마리가 날아왔다. 백로도 먹이 사냥을 하느라 바삐 고개를 뺏다 넣다 한다. 이튿날 다시 선박 마을을 찾았다. 마을 정상 쯤에 보이는 서원으로 곧장 발길을 재촉했다. ‘선호서원’이 자리하고 있었다. 1982년 새로 지어진 선산김씨 서원이다.
서원을 뒤로 하고 선박 마을 뒷쪽까지 걸어가 보기로 했다. 고개 정상에서 오른쪽으로 선산김씨 비석이 있고 옛 서원이 자리하고 있었다. 고개를 넘어 몇걸음 더 옮겼을까? 인연이라는 게 이런건가 싶었다. 어제 친절하게 동네 이곳저곳을 설명해 주시던 김현덕(84) 여사님을 다시 뵈었다.
“어디 갔다오세요? 어제 인사드렸던 함평방송입니다 .어제 뵙고 오늘 뵈니 더 반갑습니다.” “아이고 그러네요. 논에 물 보고 오요.”
김현덕여사는 21살 때 이곳 선박마을로 시집을 왔다고 하셨다. 광산김씨고 돌아가신 남편은 선산김씨라고 하셨다. 우리 집 자리가 원래 여기였다면서 손가락을 가리키셨다. 우리가 햇볕을 피해서 얘기 나누는 바로 앞 터, 김현덕 여사님의 옛집 터였다. 집은 헐리고 없었다.
“쩌기 앞에 보이는 산이 선산김씨 선산이어라우. 산뽕다리서 보면 조선대까지 보여라우.”
김현덕 여사님은 전날 처음 뵈었을 때 도 느꼈지만 잘 웃으시고 참 친절하셨다. 동네 앞쪽으로 걸어나오면서 궁금한 건 김현덕 여사님께 질문을 했다. “이 집 대문은 참 특이허네요?” 고개를 막 넘어 왼쪽 집 대문이 특이했다.
“이집 사람이 목수였는디라우 그 분이 맹글었다우.” 그러신다.
몇걸음 걸어 오른쪽 집도 여쭤봤다.
“이집은 외지인이 들어오셔서 지었는가 집을 참 잘 지어네요이?” “아니어라우 이 집 아들이 지었어라우.아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디 어매 혼 자 사는데도 이리 집을 잘 지어놨어라우. 동네 사람들한테도 잘 허고, 우리 동네 일 있을 때마다 이 집 아들 창호가 여간 잘 허요.”
마침, 마당에서 일하시던 요양사 분이 김현덕 여사님을 보고 인사를 하신다.
“네? 창호요? 저도 이름이 창호인데 이집 아드님도 이름이 창호예요?” “네 맞어라우"
요양사 분께 내 명함을 드리니 명함에 이름을 보고 웃으셨다. “ 이름이 같으니 집 한번 구경 해보세요.” 요양사 분이 뜻 하지 않은 제안을 하셨다. 웅장하고 멋지게 지어진 집에 김 현덕 여사님과 들어섰다. 86세의 노병재여사님께서는 누워 계셨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들 이름하고 똑같은 창호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다. 창호라는 아들 이름을 불러서인지 노병재여사님이 금방 일어나셨다. 얼굴이 환해지셨다. 먼저 창호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냐고 여쭈었다
“어째 이름을 창호라 지었냐면 내 친정이 구산이예요. 구산이 어딘지 알재라우. 그 동네에 안창호도 있고, 그 인근에 이창호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디 창호라고 이름을 지은 사람들이 다 잘 삽디다. 인품도 좋고 그래서 애기 낳고 우리 신랑보고 이름을 ‘창호'라고 불릅시다. 내가 얘기 했째라우. 그런게 우리 남편이 그러소. 그러대요.”
노병재 할머니의 아들 이야기는 이어졌다.
“우리 창호가 서울에서 크게 사업을 하면서 엄마 집을 네 번이나 사줬어요. 아파트도 사주고, 단독주택도 사주고 그런디 내 큰 아들이 죽어분게 못살겁습디다. 나 못 살것다. 고향으로 내려갈란다. 헌게 창호가 옛날 집을 부숴불고 이리 집을 땔싸크게 지었어요. 한 5년전에 지었을 것이요. 얼마 들여 지었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헙디다.”
이 마을 출신 창호씨가 홀로 사시는 어머니 노병재 여사님를 생각하며 옛 집을 헐고 새로 지은 집.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생각하는 창호씨 이야기에 푹 빠져 듣고 있을 때 함께 자리하고 앉은 김현덕 여사가 말을 잇는다.
“우리 동네 앞 ‘선박 마을’이라고 써진 비석있쏘안? 그 비석도 이 집 아들이 했어롸우. 비석 아래 보면 노병재라고 써져 있을것이요.” “네? 비석에 어머니 이름을 썼다 이거지요?”
추임새를 넣듯이 내가 말을 이어주자 창호씨 어머니 노병재여사님이 말을 받는다.
“쓰지마라고 그렇고 했는디 구산에서 시집왔다고 구산댁 댁호까지 써놨어라우”
인사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마을 비석 하단을 살펴보았다. 노병재 증(구산댁)이라고 쓰여 있었다.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창호씨 마음에 고개가 숙여졌다. 점심 때가 되어갈쯤 선박마을을 떠나려는데 논둑정리를 하시는 분이 계셨다. 정옥란(76)여 사님이셨다. 41년 전 남편 고향인 이곳 함평으로 귀향하신 분이셨다.
“아저씨는 어디 가셨어요?” “멀리 가버렸어요.”
괜한 질문을 했다 싶었다. 서울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내려온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은 돌아가셨다고 하셨다. 그후 농삿일을 다 맡아 하신다고 하셨다.
정옥란 여사님은 본인이 서울서 내려 왔을 때만해도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식지천 물이 둑방을 넘었다고 하였다. 지금은 둑을 높여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마을경로당 앞에 느티나무 있는 데까지 장마 때면 물이 찰랑거렸다고 말씀하셨다.
함평군 나산면 선박마을, 지금 함평과 광주 광산구 양동을 경계 짓는 표지판이 있는 곳이다. 나산면 소재지까지는 5키로 광산구까 지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다.
배를 묶어둔 선박은 역설적으로 묶어둔 배를 풀어 항해를 시작할 수 있는 마을 이름이기도 하다. 광주와 맞닿은 이 마을 앞길이 광주에서 사람들과 물류가 들어 오고 함평의 농축수산물이 팔려나가는 길로 정비되길 소망해 본다.
그 옛날 영산강을 통해 물길이 닿았던 선박마을, 그 부귀영화의 시대가 육지 길로 재현되길 고대해 본다
<저작권자 ⓒ 함평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